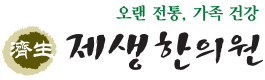화병
못마땅한 일을 당하면 왈칵 화(火)나기도 하고 서서히 한(恨)으로 맺히기도 한다. 화난다고 화풀이하려해도 뒷감당이 어렵고 꾹 눌러 참다보면 가슴에 응어리진다. 응어리를 스스로 잘 삭이는 사람도 있지만 삭이지 못하고 누적시키면 화병이 된다. 마음에 난 화상(火傷)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고통과 후유증을 남긴다.
화병의 증상은 주로 명치를 중심으로 답답하면서 화기(火氣)가 치밀어 오르고 숨이 막히는 듯 하다. 가슴을 누르면 아프고 입이 마르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도 아프다. 정신적으로도 분노 피해의식과 함께 우울하고 불안하고 조급하다.
세계가 화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실제 미국의사들이 한국 환자를 진찰할 때 정신과적으로 진단도 치료도 할 수 없는 특이한 증상에 난감해 한 적이 많았다. 결국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야 한국의 독특한 문화결합증후군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92년판 미국정신의학회 진단기준(DSM) 제4판에 비로소 화병이 등장하게 된다. 병명도 한국발음 그대로 ‘Hwa-byung’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국인으로써 자부심을 가져야 할지는 참 애매하다. 단지 한국의 공식질병 화병을 서양에서 다루는 것이 어딘지 어색하다. 정신과 전문의 사이에서도 화병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다뤄야 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그래도 현대의학이 화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화병은 한의학에서 수천 년간 다루어져 온 친숙한 질병이다. 한(恨)많고 감성이 풍부한 한민족 고유의 특성상 화병은 다른 질병에 앞서 고려된다.
한의학의 기초가 음양오행(陰陽五行)인 만큼 화(火)에 대한 파악과 대처 역시 쉽고도 체계적이다. 인체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중 하나인 화는 심장에서 관장하며 심장은 감정 및 스트레스까지 관리한다. 심화상염(心火上炎)은 심화를 타오르는 불길에 비유한 말이다.
억울한 마음을 삭이지 못하면 울화증(鬱火症)이 생긴다. 머리와 옆구리가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성을 잘 낸다. 맥이 현삭(弦數)하면 간화(肝火)가 왕성해진 증상으로 본다.
화병에는 황연 황금으로 청열(淸熱)시키고, 오약 향부자로 이기(理氣)시키고, 맥문동 당귀로 자음(滋陰)해주고 원지 산조인으로 안신(安神)시키는 처방을 낸다. 그 외 침구(鍼灸)요법과 최근 각광받는 향기(香氣)요법이 유효하다.
화병은 폐쇄적이지만 끈끈한 인간관계가 얽힌 공동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정신신경증상이다. 고집불통 남편을 두거나 고된 시집살이를 겪은 중년이후의 가정주부가 주 된 환자다. 그런데 문화와 세월 따라 며느리에게 시달린 시어머니환자나, 바람난 아내 때문에 속 태우는 남편환자도 늘어간다. 그야말로 문화결합증후군이다. 진료하다보면 화병은 약자(弱者)만이 표현할 수 있는 본능적 시위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현대 조직사회에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스트레스성 질환은 화병 개념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사계절의 다양함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감정의 폭이 가장 넓고도 다양한 민족이 한국인이다. 이에 걸맞게 화를 삭일 줄 아는 지혜도 배양해야 한다. 하지만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허허허 웃어넘기기란 쉽지 않다.